정선군청 기관지 "아라리 사람들"에 명예 기자를 맡으면서 "아리리 사람들"에 기고한 글들 입니다.
아라리 사람들의 다른 호나 다른 글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삼시 세끼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요란스럽게 울린다. 휴대폰을 들고 버튼을 눌러 전화를 받으며 내가 말한다. "여보세요?" "응, 나야, 아까 전화 안 받던데?" 상대는 아내이다. 아내가 아까도 전화를 했었던 모양이다. "응, 아버님 저녁 식사 차려드리고, 설거지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 "그래, 수고가 많네. 고마워". 위 대화는 몇 년 전 자주 반복되었던 아내와 나의 통화 내용이다. 마치 아내와 남편이 바뀐 듯한 상황이다. 이런 대화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이렇다.
원주의 한 아파트로 이사해 사시던 장인어른께서 무료한 도시 생활에 지친 나머지 근교에 농지가 딸린 작은 농가를 고심 끝에 사서, 왕래하며 텃밭 농사를 지으셨던 적이 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운전하던 차량이 운전 부주의로 사고나 같이 타고 있던 장모님과 함께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두 분 모두 며칠 동안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셔야만 했다. 급기야 연로하신 장인이 운전하는 것을 걱정하던 나를 포함한 자식들은 장인의 차를 당분간 지인에게 맡겨 놓기로 했다. 농가는 내가 머물면서 당분간 관리를 해주기로 하였다. 당시, 나는 외국에 살면서 가끔 일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곤 했는데, 그때 마침 내가 한국에 들어와 그 집에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었다. 그러나 병원에서 퇴원한 장인어른은 아파트에만 있을 수 없었다. 본인이 우여곡절 끝에 산 농가이고, 그동안 심어 놓았던 채소들과 직접 장에서 골라 사와 키우고 있는 개와 닭 때문에 자가용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버스와 택시를 갈아타며 농가로 오셔서 둘러보고 가곤 하셨다. 더구나 가끔 농가에 오시면 하루, 이틀 정도 주무시고 가곤 하셨다. 시골 농가에 사위인 내가 기거하며 닭과 개 그리고 토마토, 고추들을 돌보고 있으니 한층 편하게 농가에 오시고 자주 주무시고 가시게 된 것이다. 아마도 내가 농가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의지가 되어 편하게 주무시고 가시는 듯했다. 나 또한 우리 가족이 외국에 있는 몇 년 동안 아들을 데리고 있어 주신 처가 어른들께 작게나마 보답하는 것 같기도 하고, 농사를 도와 드릴 수 있어 마음이 한결 편했다. 그리고 장인과 함께 있는 동안 정치 얘기, 싸가지 없는 앞집 아줌마 얘기, 장인어른께서 살아왔던 삶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단둘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없어 보이지만 찾으면 무척이나 많은 농사일과 누렁이의 훈련과 재롱, 닭들과의 전쟁은 나와 장인의 매일 매일을 바쁘게 지나가게 했다.
그런데 당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를 괴롭혔다. 바로 삼시 세끼의 해결이다. 평상시는 문제가 없는데, 장인어른이 주무시고 가시는 날이면 매끼 해결이 나에겐 큰 문제였다. 나 혼자 있으면 그냥 간단한 반찬에 밥이나 라면을 해 먹을 수도 있고, 읍내에 나가서 간단한 간편식을 사다가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굶을 수도 있지만 주무시고 가시는 1박 2일이면 그럴 수가 없었다. 삼시 세끼 준비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 줄 그때 처음 알았다. 장모님 외에는 남에게 생전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았던 장인인지라 나에게 핀잔을 주거나, 눈치를 주지는 않지만, 장인어른께서 해주시는 끼니를 얻어먹을 수 없었던 사위인 나로서는 삼시 세끼를 내가 책임 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시나브로 다가오는 끼니때가 되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머리가 복잡해졌다. 특히나 해도 미처 뜨지 못한 새벽녘에 잠이 없어 일찍 일어나신 장인어른께서 어제 저녁에 내가 미처 하지 못한 설거지를 하시면서 밥을 하시려 달그락거리면 그 소리는 고요한 새벽에 천둥소리처럼 내 귓가를 울렸다. 마치 알람 소리를 미처 듣지 못하여 못된 시어머니의 호통 소리에 일어난 며느리처럼 화들짝 놀라 부엌으로 달려가면서 내가 하겠노라 말씀드리곤 했다. 이럴 때면 사위에게 아침밥을 시키게 되어서 미안해하는 백발의 장인 모습과 그 모습이 또 미안한 반백의 사위의 모습이 마치 의좋은 형제가 볏짐을 서로 진 채 새벽 들녘에서 만나는 모습이 되어버리곤 했었다. 그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어찌 보면 우습고, 어찌 보면 처량하였다.
장인께서 1박 2일을 농가에서 지내고 시내로 돌아가는 날이면 나는 남편의 출장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이후 만끽할 수 있는 자유로움에 미소 짓는 주부처럼 적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끼니를 내 멋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에 혼자 즐거워 콧노래를 부르곤 했었다. 요즘 정선에 있을 때 나는 혼자 생활할 때가 많다. 그럴 때면 나는 그때처럼 또 삼시 세끼를 고민한다. 그리고 매번 의문을 갖는다. 삼시 세끼를 꼭 다 먹어야 하는가?라고. 하지만 나는 곧 또 쌀을 씻는다.
'정선에 살어리랏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문해교사 양성과정을 수료하다. (0) | 2019.02.02 |
|---|---|
| [아라리사람들]가을, 독서 그리고 빨간책방(201812) (0) | 2018.12.04 |
| [아라리사람들]닭 모가지를 누가 비틀 것인가?(201808) (0) | 2018.09.03 |
| [아라리사람들]친절한 한국인 그리고 “May I help you?”(201806) (0) | 2018.08.30 |
| [아라리사람들]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201804) (0) | 2018.08.2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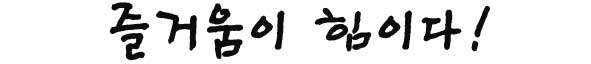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