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중에는 제목이 유독 눈에 들어오는 책이 있다. 분명 읽지 않았음에도 읽었다는 착각이 들고, 내용을 전혀 모르면서 마치 아는 것 같은 그런 책들 말이다. 대부분 고전이 그러하고 걸작으로 꼽히는 책들이 그렇다. 나에게는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 이 책이 그러하다. 어디에선가 많이 본 책인 것 같기는 한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분명 집에 이 책이 있지는 않다. 그런데 유독 이 책의 제목이 눈에 띄었다. 그래서 인천의 배다리 헌책방에서 이 책을 보고 마치 계속 찾고 있었다는 듯이 책을 뽑아 들었었다. 그런데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책의 내용보다는 책의 저자였다. 나의 기억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작가인데 내가 이 작가를 알고 있었다. 내 독서에 관련한 모든 지식은 빨간책방에서 가져왔다. 짐작하듯이 이 저자에 대한 정보도 빨간책방 87회, 88회에서 들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로맹 가리'는 자신의 명성으로 글을 평가 받는 것이 아니라 글로만 평가를 받고 싶어서 '에밀 아자르'라는 필명으로 '자기 앞의 생'을 써서 프랑스 최고 문학상 공쿠르상을 탄 작가다. 본명인 '로맹 가리'로도 콩쿠르상을 탔으니 한 사람이 프랑스 최고 문학상을 두 번 타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작가라는 것이다. 다행히도 나는 몇 년 전에 '에밀 아자르'의 책을 읽었었다.
처음에 이 책 또한 장편인 줄 알고 책을 읽기 시작했었다. 하지만 이 책은 16개의 단편으로 구성된 단편집이다. 전체 분량도 역자 후기를 합해서 271쪽에 불과하다. 결국 한편의 단편 분량이 16쪽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 대부분 아주 짧은 단편들이라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이 쉽지는 않다. 이 단편집의 주제는 인간 군상들의 내면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어떤 단편에 나오는 인간은 이해되기도 하고 어떤 단편에 나온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띠기도 한다. 16편의 소설 중 어느 소설은 조금 무겁고, 어느 소설은 콩트 같기도 하고, 어떤 소설은 블랙코메디 같다. 그리고 인간들이 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내면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아주 비관적으로 이 책은 쓰고 있다. 짧은 소설들이라 시간 날 때마다 한 편씩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소설집이다. 88점
'독서 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1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문학동네)-김중혁 외 (0) | 2019.03.12 |
|---|---|
| 복수의 심리학(반니)-스티븐 파이먼 (0) | 2019.03.05 |
| 핑거스미스(열린책들)-세라 워터스 (0) | 2019.02.16 |
| 갈팡질당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문학동네)-이기호 (0) | 2019.02.10 |
| 철학자와 늑대(추수밭)-마크 롤랜즈 (0) | 2019.02.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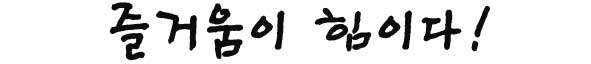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