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1987”을 보았다. 나와 같은 85학번인 부인과 군 제대 후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과 함께였다. “응답하라! 1988” TV 드라마가 열풍을 일으키던 때, 내가 대학 다니던 시절의 대학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응답하라! 1988” 드라마가 비슷한 시기이기는 했지만 그 드라마의 배경은 이미 내가 대학을 떠난 후의 모습이었고, 최루탄의 매캐한 연기와 깨진 보도 블럭, 화염병에 둘러 쌓여 있던 나와 집사람이 다니던 대학 모습은 아니었다. 그런데 영화 “1987”은 내 삶의 한 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 대학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학생 운동을 하며 이후 당연히 나아갈 길로 여겼던 노동 운동의 영역을 기웃거리던 그 시절이었다.
“1987”은 드라마라기보다는 다큐멘터리에 더욱 가까웠다. 많은 실존 인물이 나오고, 그 시대의 모습 그대로 화면에 담아냈다. 그 친구, 그 동지는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영화 배경이 바뀔 때마다 나도 모르게 하게 되었다. 그 시대의 긴장감과 공포가 다시 떠오르게도 하였다. 2시간 남짓의 영화가 끝났음에도 내 몸을 사로잡고 있는 영화의 여운에 자리를 쉽게 뜰 수 없었다. 평일 오후라 극장은 한산했었다. 약 20여 명의 관객이 함께 한 것 같았다. 관객 중에는 소수의 젊은 관객도 있었다. 영화가 끝나자 그들은 나와 다르게 영화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 출구로 향했다. 영화가 끝난 후에도 나와 같은 심정으로 자리를 뜨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 또래의 중년 남녀였다.
영화의 감상평을 채 머리에서 정리하기 전에 눈앞에 보여지는 이 상반된 두 세대의 모습은 나로 하여금 이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하는 의문에 빠지게 했다. 이 모습은 바로 내 옆에서도 일어났다. 나의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영화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었지만 같이 온 아들은 옷을 챙기며 출구 주변을 탐색하고 있었다.
우리는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사는거야”라며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웃고 떠들곤 한다.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 모임들은 비슷하다. 성년이 되어 만나는 모임들은 미래를 얘기하며 장래를 설계하기 보다는 추억을 곱씹으며 과거를 회상하고 웃고 떠드는 모임이 대부분이 된다.
2014년 연말에 개봉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기에 박정희 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박근혜 정권을 미화하는 관제 영화라는 것이 진보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견이었고, 보수주의자들은 박정희 시대에 이룩했던 경제성장과 그 시대의 주역이었던 지금 어른들의 노고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칭찬했다. 내 주위 대부분 사람은 진보적인 입장을 취해 이 영화를 보지 않았으며, 사람들에게 권하지 않았다. 나도 그랬다.
이 영화는 2018년 1월 기준으로 1400만 관객이 관람했다. 영화 국제시장의 작품성이나 이념성, 내용을 따지기 이전에 나는 이 영화를 누가 보았을까 생각해보았다. 1400만의 관객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데이비드 실즈”의 책 제목처럼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모두 늙다가 어느 순간에 죽는다. 하지만 죽음과 동시에 내가 완전히 잊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의 작은 흔적이나마 우리 가족이, 내 친구, 내 과거 동료가 기억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기억은 나를 긍정적으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나를 원망하며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 나의 나의 아버지도, 나의 할아버지들도 그리고 나 보다 먼저 살다간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국제시대” 배경인 시대를 비판한다. 물론 나도 그렇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다. 우리는 당시 위정자들을 비판하는 것이지, 그 시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가끔 그 시대를 부정하는 과오를 범하고, 그 시대의 민중들을 그 시대와 동일 시 하며,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그 시대의 위정자에게 협조한 부역자(附逆者)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살던 시대를 부정당하는 것은 그 시대에 온 몸을 바쳐 일했던 사람들로서는 자신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는다. 우리의 늙은 할아버지들도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인정받고 싶을 것이다. 공산화로부터 나라를 지켰다는 한국 전쟁의 전사로, 이웃 나라를 구하는 명목으로 파병된 베트남전쟁의 구세주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떠나야 했던 중동과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는 산업의 전사화 기억되고 싶을 것이다. 일부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오는 할아버지들은 그것을 알아달라며 그 시대의 상징인 조국, 근대화, 박정희를 외치며 “우리가 이 나라를 만들었어”라고 외치며 젊은이들에게 욕지거리를 하는지 모른다.
영화 “1987”를 자식들과 보고 싶었던 것은 내 자식에게 내 과거를 보여주고, 내 과거를 함께 추억하고, 내가 저 시대를 살았고, 너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음은 내가 저 시대에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인지 모른다. 그리고 추억을 되새김질 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하다. 아마 “국제시장”의 시대를 살았던 아버지들도 나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살았던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고,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했다. 어쩌면 나도 모르게 거부했는지도 모른다. 그들이 추억을 되새기는 것 마저 거부한 것이다.
나는 고민해 본다. 내가 나의 삶을 추억하고 내 추억을 자식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만큼, 내 부모 세대를 공감하고 추억하며 그들을 이해하려고 했는가를, 그리고 혹시 그들이 추억조차 누리지 못하도록 내가 가로 막아 버린 것은 아닌지 말이다.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빨간 책방 종영 그리고 아쉬움 (0) | 2019.06.27 |
|---|---|
| 한국 버스 그리고 싱가포르 버스 (0) | 2018.03.02 |
| 출장과 여행 사이(베니키아 월미도 더블리스 호텔 투숙기) (0) | 2017.12.09 |
| 인천 맛집 이화찹쌀순대의 폐업과 몇 가지 추억 (2) | 2017.09.28 |
| 운동(sports)과 운동(movement) (0) | 2017.06.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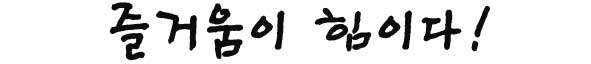






댓글